our Strategy Partner News
- 관리자
- 2024-09-08
- 조회: 322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밸류체인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분석합니다.
오픈AI의 챗GPT로 촉발된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데이터→반도체→데이터센터로 이어지는 인프라부터 데이터→대규모언어모델(LLM)→서비스로 연결되는 소프트웨어(SW) 영역까지 모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끄는 형국이다. 뛰어난 기술력에 막강한 자본력까지 갖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AI 시장을 개척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매그니피센트세븐으로 불린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등은 미국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하며 증시를 이끌었다. 미국의 기세에 대적할 만한 국가로는 중국이 꼽힌다. 중국은 이미 AI 관련 논문과 특허 수에서 미국을 앞섰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AI는 내수시장에서 주로 활용됐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 관계와 보안 등의 이유로 중국의 AI를 도입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유럽과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프랑스와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 주요 국가들도 자체 LLM 개발에 나섰다. 정보기술(IT) 경쟁력이 뒤진다는 평가를 받던 일본도 AI 국가전략을 발표하며 정부 차원에서 AI 키우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생성형AI 밸류체인(가치사슬)의 각 영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LG·SK텔레콤·KT를 비롯한 한국 대표 IT 기업들과 리벨리온·포티투마루·솔트룩스·업스테이지 등 스타트업들은 인프라와 SW 영역에서 미국 기업들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자본력에서는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뒤지지만, 기술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중무장해 각각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버틴 메모리반도체
생성형AI의 시작은 데이터다. AI는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하며 점점 똑똑해진다.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면 AI는 무용지물이다. 데이터가 있어도 품질이 좋지 않으면 생성형AI도 영리해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양질의 빅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AI 경쟁에서 유리하다.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과 메타다. 구글은 한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장악했다. 전 세계인들이 구글로 검색하고 각종 콘텐츠를 작성하는 과정이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인다. 구글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AI LLM '제미나이'를 내세웠다. 메타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했다. 메타는 오픈소스 기반의 LLM '라마'를 내놓았다. 오픈소스는 무상으로 공개되는 소스코드나 SW다. 누구나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SW를 제작해 배포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AI 서비스 기업들은 오픈소스 라마로 자신만의 서비스를 만들었다. 라마 기반의 서비스와 사용자가 늘어나면 메타는 라마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 그만큼 AI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된다.
한국의 데이터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구글의 공세 속에 한국 검색 시장을 지키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구글과 유튜브의 검색 점유율이 꾸준히 올랐지만, 네이버는 아직 한국 검색 시장의 강자다. 한국인들이 네이버에서 입력하는 검색어와 블로그·카페 등에 올리는 콘텐츠 등이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다. 네이버는 이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LLM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였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검색엔진을 갖춘 만큼 한국어에 강점을 가진 AI라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톡'을 보유했다.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콘텐츠·쇼핑·결제·투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의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그만큼 다양한 데이터가 쌓인 것이 강점이다.
생성형AI 밸류체인의 인프라 영역에서 데이터에 이은 단계는 반도체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뛰어난 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사람의 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반도체 중 특히 AI 학습에 특화된 반도체를 설계하는 대표 기업은 엔비디아다. PC에 장착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대표기업이었던 엔비디아는 GPU가 AI 학습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대표 AI 반도체 기업이 됐다. 엔비디아의 H100을 필두로 한 호퍼 시리즈는 현재 AI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큰 AI 반도체다. 오픈AI·구글·메타 등 AI 빅테크 기업과 전 세계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엔비디아의 호퍼 시리즈를 구매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인기는 높다. 엔비디아는 호퍼 시리즈에 이어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AMD와 인텔이 AI 반도체에서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미미하다.
메모리반도체는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장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에 탑재될 HBM3E(5세대) 제품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생성형AI 시장의 큰손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HBM3E의 품질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품질검증이 완료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E를 공급하는 시점이 언제일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엔비디아도 HBM3E 공급처를 SK하이닉스로만 국한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엔비디아의 신제품 개발 및 출시 계획에 민감하다. 엔비디아가 신제품 계획을 내놓으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에 맞춘 메모리반도체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소부장 발주로 이어진다.
한국 소부장 기업 중에서는 한미반도체와 주성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이다. 한미반도체는 HBM 제조에 필요한 '열압착(TC) 본더'를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증착공정용 장비가 주력 제품으로 SK하이닉스와 중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CXMT에 주로 제품을 공급한다.
AI 반도체가 주로 쓰이는 곳은 데이터센터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인 오픈AI·구글·메타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업자(CSP)들도 데이터센터 시장의 큰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MS·구글이 대표적이다. 3사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이용하지만 자체적으로도 AI 반도체를 개발해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업종에 최적화된 AI 반도체를 개발해 비용을 줄이면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AWS의 그래비턴·트레이늄·인퍼런시아와 구글의 TPU 등이 자체 개발 AI 반도체로 꼽힌다. 한국의 대표 CSP는 NHN클라우드·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 등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에서 공급되는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는 스마트폰·노트북·가전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노트북·가전에도 AI를 접목하고 있다. LG전자도 AI 가전과 AI 노트북을 선보이며 삼성전자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LLM 내놓은 네이버·LG·KT…'돈 버는 AI' 고심
생성형AI 밸류체인을 SW 영역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다음 단계는 데이터를 학습하며 탄생하는 LLM이다. 글로벌 LLM 시장에서는 오픈AI(GPT)·구글(제미나이)·메타(라마) 등이 주요 기업으로 꼽힌다. 오픈AI의 GPT4는 챗봇 챗GPT와 MS의 검색엔진 '빙'에 도입됐으며, 미국 통합 변호사시험 상위 10%의 성적을 냈다. 한국어 정확도는 70% 이상이다. 제미나이는 지메일과 구글 문서 등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됐다. 메타는 라마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며 자체 생태계를 키워가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로 한국어 특화 LLM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LG는 엑사원을 내놓았다. KT도 믿음을 개발하며 통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LLM을 만들었다. 포티투마루·업스테이지·솔트룩스 등 스타트업들과 파수 같은 보안기업도 자체 LLM 및 소형언어모델(sLLM)을 선보이며 주로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기업들의 고민은 'AI 수익화'다.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이 AI로 매출을 올리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이 LLM이나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지만, 아직 초기라 당장 눈에 띌 만한 매출을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은 기업·소비자간거래(B2C)보다 B2B 시장에서 매출을 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기업들이 생성형AI를 도입해 단순반복 업무를 줄이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에 생성형AI의 기능에 대해 문의하거나 유료로 기술검증(PoC)을 하는 기업도 다수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생성형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아직 많지 않다. 한 AI 전문기업 대표는 "기업들이 아직은 생성형AI가 무엇이고 자사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파악하거나 시험하는 단계"라며 "그나마 복잡한 약관이나 다양한 고객 사례를 찾아 분석해야 하는 금융사들이 조금씩 도입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불거진 'AI 회의론'도 한국 AI 기업들이 넘어야 할 산이다. AI 기술은 발전했지만 정작 AI로 돈을 버는 기업은 많지 않은 데 대해 AI 회의론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향후 1~2년은 AI 기업들이 제대로 된 매출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고정비용을 줄이고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데 AI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공감하는 기업들이 많다. 결국 1~2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생성형AI를 도입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 기간에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갖춘 AI 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정리되는 '옥석 고르기'가 진행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국내 AI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AI기본법'이다. AI기본법이 꼭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식의 진흥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토종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AI 기업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은 자체 AI 기업이 적은 편이라 사실상 미국 빅테크들을 규제하기 위한 'EU AI법'을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토종 AI 기업들이 많아 반대로 AI 진흥책을 펼쳐야 한다"며 "일본도 AI를 일으켜 AI 스타트업 중 유니콘이 나온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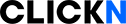


댓글 0